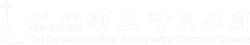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걷고 또 걸었다. 그 광야는 척박하나 아름다운 광야였다. 광야에는 볼만한 것, 기댈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척박하다. 그러나 그 광야에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름다웠다.
그들의 광야에는 성막이 있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였다. 그들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
성막에는 문이 동쪽에 하나만 있었다. 구원의 문이 하나인 것과 같다. 광야에 바람이 이리저리 휘몰아친다고 구원의 길도 이리저리 열려있는 게 아니다. 현대의 안이한 환경에서 창궐한 다원주의는 어림도 없던 곳이 광야였다. 다원주의를 수용한 예배는 우상숭배의 자리일 뿐이다.
유일한 문으로 들어서면 놋 번 제단이 있었다. 모든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는 곳이요 태우는 곳이다. 죄를 사하기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함이 마땅한 자리다.
놋 번 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놓여 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기에 보혈의 샘에서 씻고 또 씻어 정결해져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구원의 구조는 “이미, 아직”(already, but not yet)임을 이해한다면 예배 때마다 더러움을 또 씻어야 하는 물두멍의 역할도 이해할 수 있다.
성소에 들어서면 가운데 남쪽에 등대가 있다. 예배에는 성령의 비추임이 항상 있어야 한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은 개인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고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면, 다양한 은사로 봉사하는 교회를 꿈꾼다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다.
성소의 북쪽에는 떡상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절실한 문제는 떡의 문제다. 떡은 사람으로 살게도 하고 자라게도 한다. 성소 안의 떡상은 생명의 양식이다.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
예배에 참여해 입을 열면 하늘 양식이 채워진다. 하늘 양식을 갈망함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이 다윗처럼 쏟아진다. 이 하늘 양식은 영적으로 살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
성소의 가운데에는 향단이 있다. 향단에서 퍼지는 향은 예배 가운데 기도를 의미한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예배는 기도하는 예배가 돼야 한다. 교회의 합심 기도는 늘 하늘 문을 열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일궜다.
성소의 휘장이 걷힌 곳에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말씀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다. 중세시대에 언약궤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었다. 전통이 그 자리에 있곤 했다. 교황과 전통이 진리의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치워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기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성막이 함께 있었기에 예배가 마르지 않았다. 그들은 예배로 광야 40년을 넉넉히 이겼다. 오늘의 광야에도 예배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